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배달앱 TOP3 (Glovo, Rappi, Pedidosya) Part1.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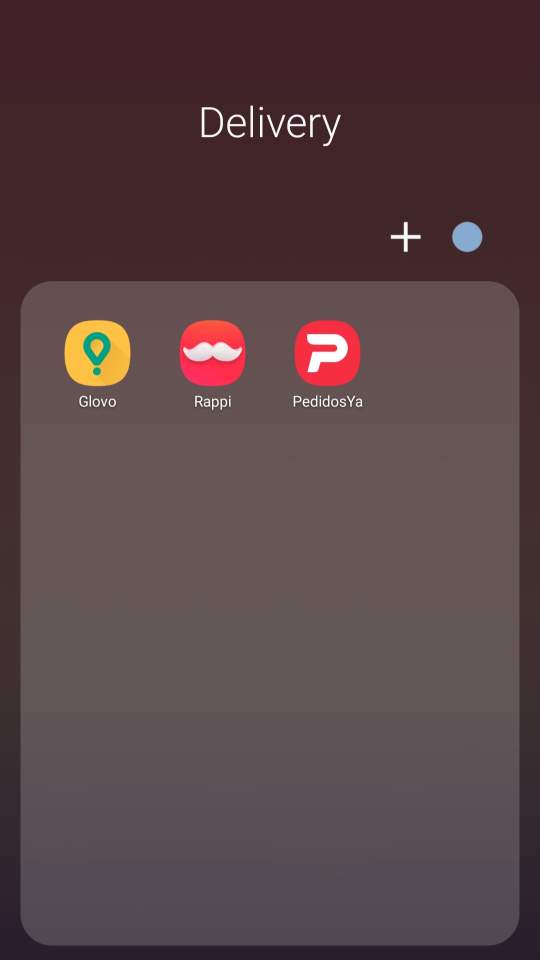
한국에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있듯이, 아르헨티나에도 우리들의 맛있는 음식을 배달해주는 배달 어플리케이션 회사들이 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쓰는 어플 3개는 Glovo (글로보), Rappi (라삐), Pedidosya (뻬디도샤) 이렇게다.
공교롭게도 위의 회사들은 모두 아르헨티나 자국회사는 아니다. 하지만 모두 스페인, 중남미 출신 회사로 같은 언어권으로부터 나왔다.
기업의 경쟁은 소비자들에게 소소한 이익들을 가져다준다. 세 개의 업체가 열심히 경쟁해줘서 각종 프로모션으로 인한 할인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경쟁구도를 보는 재미도 솔솔 하다.
TOP 3 소개
1. Glovo
- 2015년에 창립된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 회사. 로고도 심플하고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브랜드 컬러가 확실해서 비교적 브랜드 인식이 잘되는 편이다.
- 음식 배달 말고도, 정말 다양한 것들이 배달된다. 편의점, 슈퍼마켓, 약국, 꽃집의 물건들을 배달해준다. 거리에 따라 배송비가 달라지는데, 배달 범위 내에서 69~99 페소 (한국돈 약 1~2천 원) 정도 된다. (**페소는 아르헨티나 페소 기준. 환율의 상승률이 커서 한화는 대략적으로 표기)
- Delivery Express라는 항목도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퀵배송이다. 예를 들어 내가 친구한테 전달해야 할 물건이 있으면 내 물건을 배달해준다. 배달 거리로 가격이 측정된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최소거리는 112 페소 (약 2천 원) 고, 6.6km 거리라고 했을 때 373페소 (약 5~6천 원)이다. 비쌀 수 있지만, 그만큼 급한 사람에게는 아쉬울 금액은 아니다.
- 내 디바이스가 영어로 설정되어있어서 그런지, 어플리케이션의 언어도 자동으로 스페인어가 아닌, 영어로 설정되는 센스. 다른 중남미 어플은 Only Spanish.
2. Rappi
- 2015년에 창립된 콜롬비아 출신 회사.
- Rappi Prime이라는 프리미엄 멤버십 서비스가 있다. 가격은 199 페소 (한화 약 3~4천 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내용은 179 페소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모든 배달비 무료. 진짜 좋은 건 Excluvie 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 회원 등급제도가 있어서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혜택이 주어진다.
- Paga con Rappi (Pay with Rappi)라는 현금 적립 서비스가 있다. 카카오페이처럼 현금을 충전해 송금할 수 있고, 현금 결제도 가능하다.
3. Pedidosya
- 2009년에 아르헨티나 옆 나라인 우루과이에서 나온 회사다. 스타트업의 창립 스토리스럽게 3명의 대학 친구가 아이디어를 모아 만들었다. 2020년 현재까지도 이 셋은 CEO, CMO, CTO를 맡고 있다. 처음에는 전화기의
자동응답과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사업이 잘되어 2014년부터 멕시코를 시작으로 중남미 시장에 발을 디뎠다.
- 규모가 커지자 2014년에는 Devliery Hero 그룹에 인수가 되었다. 참고로 Delivery Hero는 중동, 유럽, 아시아, 중남미 등 모든 배달회사들을 인수해버리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진 독일 회사인데, 국내에서는 요기요 인수에 이어 얼마 전에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해 화제가 되었다.
- Glovo와 같이 음식 배달뿐 아니라 다른 품목들도 배달이 되고, 퀵배송 서비스도 존재한다.
- 어디서 들은 이야기로는 이 셋 중에 음식점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가장 낮게 책정된다고 한다.
- Pedidosya Plus라는 프리미엄 멤버십 서비스가 존재한다. 한 달 99페소 (약 2천 원)을 내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모든 배달 건에 대해 배달비가 무료로 제공된다.
한국 배달 시장과 다른 점
문화권도, 경제구조도 다른만큼 배달 시장에서도 다른 점들이 눈에 띈다.
# 자전거를 탄 배달원들; 긱 경제
세 회사는 긱 경제 (Geek Economy : 빠른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정규 프리랜서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경제 현상. / 매일 경제용어사전 출처)에 기반으로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우버 드라이버들을 운영하는 방식처럼, 배달원들은 한번 등록만 하면 아무 때나 배달을 할 수 있다.) 주 수입원인 경우도 있겠지만, 주로 부업으로 배달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비교적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전거를 이용해 배달을 한다. 배달의 민족도 배민 커넥트라고 해서 자전거로 하는 배달 서비스를 작년에 론칭했다. 한국 배달시장에 들어왔다가 이제는 사업을 접은 우버 이츠 (Uber Eats)의 배달원들도 자전거를 탔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수요에 따라 공급이 변화하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비즈니스 구조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 보인다.
# 음식 말고도 다 배달됨.
세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배달 뿐 아니라 다른 물건들도 배달 시킬수 있다. 온라인쇼핑 주문의 '배송'과는 엄연히 다르다. 배송지 근방의 슈퍼에서 필요한 물건을 배달원들이 집까지 가져다 준다. 심지어 정육점에서도 배달을 해준다. 이 부분은 아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국에서는 왜 이런 서비스가 없을까? 이런 시도를 이미 했는데 실패했던 것이라면 왜 실패한것이고, 애초에 시작을 하지 못했다면 문화적인 차이나 장벽이 어떤게 있을지 궁금하다. (아시는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ㅠㅠ)
한국의 배송서비스는 정말 대단하다. 특히 우리나라 물류 유통계에 큰 획을 그은 쿠팡만 보더라도 전날 밤에 주문하고 아침에 일어나보면 문앞에 이미 박스가 도착해있다. 대형서점에서 책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다음날이면 도착한다. 이건 배송서비스 얘기다. 그리고 배달서비스는 이미 역사가 오래됐다. 짜장면이나 치킨은 그 어느곳에서도 배달을 받을수 있다. 이건 좀 사심이 들어간 말이지만, 미국에서 우버이츠가 유행하기 훨씬전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배달문화가 더 발달되었다. 근데 왜 편의점이나 슈퍼, 약국은 배달이 안될까?